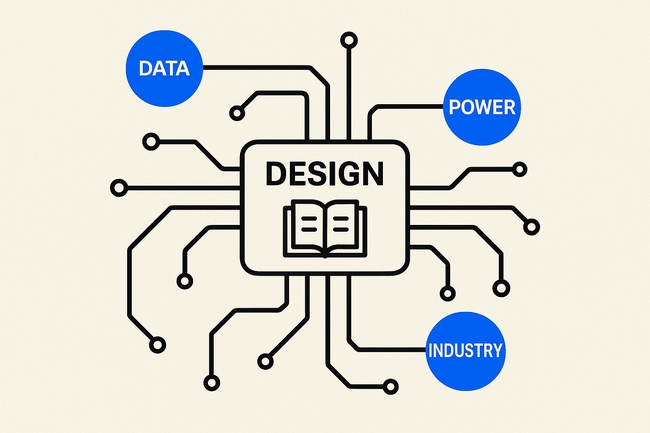 데이터·전력·산업은 하나의 회로로 수렴하고, 그 중심에는 ‘설계(Design)’가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데이터·전력·산업은 하나의 회로로 수렴하고, 그 중심에는 ‘설계(Design)’가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목차(Contents)
서문(Prologue)
제1부. 철학과 구조 ‘자본주의의 행정헌법’
제1장 데이터‧전력‧산업의 삼위일체
제2장 주식시장의 헌법 ‘ETF와 패시브 통치의 시대’
제3장 세계 3대 자본체제 ‘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의 삼권분립’
제2부. 국가의 귀환 ‘산업주권의 헌법’
제4장 트럼프의 귀환과 산업주권 2.0
제5장 산업주권의 헌법 ‘설계의 책임을 지다’
제3부. 문명과 기록 ‘기자의 주석’
제6장 기록자의 주석Ⅰ ‘철학적 주석’
제7장 기록자의 주석Ⅱ ‘현장 르포’
에필로그(Epilogue)
저자 약력(Author’s Profile)
부록(Appendices)
A. 핵심 개념 해설 (Glossary of Core Concepts)
B. 각주 및 주석 (Endnotes)
C. 색인(Index)
D. 참고문헌(Bibliography)
E. 요약(Abstract)
서문 (Prologue)
“AI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다”
AI is not a technology but a form of power
그 사실을 나는 2023년 11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 인수계약이 마무리되던 날 실감했다. 브루크필드(Brookfield)와 카메코(Cameco)가 주도한 그 거래는 단순한 산업 투자 이상의 선언이었다. 자본의 철학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ESG라는 이름 아래서 외면 받던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로 재분류되던 그날, 자본은 스스로의 윤리를 수정했다. 기술의 시대가 끝나고, 설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AI는 인간이 만든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설계하는 체계(System of Design)가 되었다. 데이터는 연료가 아니라 권력이었고, 전력은 생산이 아니라 통치였다. AI가 국가의 정책을 대체하고, 자본이 헌법의 조문을 대신 쓰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에너지정보청(EI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소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분배하느냐’였다. 전력의 설계권(Power Design Right)이 문명의 병목으로 떠올랐다.
과거 시장의 규범이던 ESG는 이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와 ‘산업주권(Industrial Sovereignty)’의 언어로 바뀌었다.
AI 자본주의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권력의 재편이다. 데이터는 움직임의 신경망이고, 전력은 그 신경망을 움직이는 혈류다. 그리고 그 연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만이 아니다. 시장이 헌법을 쓰고, 자본이 행정권을 가지며, AI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문명은 다시 국가를 호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의 이름으로.
제1부. 철학과 구조 ‘자본주의의 행정헌법’
제1장 데이터‧전력‧산업의 삼위일체
(The Trinity of Data, Power, and Industry)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지만, AI는 인간의 결정을 설계한다.
근대의 자본주의가 ‘생산(Production)’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AI 자본주의는 ‘설계(Design)’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 체제는 데이터(Data), 전력(Power), 산업(Industry)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삼위일체다.
1. 기술의 끝, 설계의 시작
20세기의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지만, 21세기의 AI는 인간의 판단을 대체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를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 불렀다. 권력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관리이고, 통치는 통제의 예술이 아니라 설계의 기술이다.
푸코 이후의 권력 이론을 ‘심리·디지털 권력’으로 확장한 철학자 한병철(Byung-Chul Han)은 ‘투명사회(The Transparency Society)’에서 “정보는 신뢰를 제거한다. 신뢰 없는 사회는 제도 대신 시스템을 발명한다.”고 썼다. 이 말은 AI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겨냥한다. AI는 신뢰의 기반이 아니라, 계산의 기반 위에 세워진 통치체제다.
오늘날 블랙록(BlackRock)의 ‘알라딘(Aladdin)’ 시스템, 오픈AI(OpenAI)의 거대언어모델(LLM),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예측 알고리즘은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인간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과를 설계한다는 점이다. 이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구조가 아니라, 문명의 헌법적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2. 데이터‧전력‧산업의 결합
AI는 전기를 소비하지 않는다. 전력을 지배한다.
데이터센터는 이제 군사기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쓴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연산(Computation)이 전력수요 증가의 70% 이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숫자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주권의 재배치다.
데이터는 신경망(Nerve Network)이고, 전력은 생명(Blood Flow)이며, 산업은 육체(Body)다.
이 삼위일체 구조가 바로 AI 자본주의의 기본 헌법이다.
과거의 자본주의가 ‘노동‧자본‧국가’의 축으로 움직였다면, 새로운 체제는 ‘데이터‧전력‧산업’의 순환으로 작동한다. 국가는 그 사이에서 설계자이자 관리자이며, 때로는 피지배자다.
“전력의 흐름을 설계하는 자가 곧 주권자다.”
이 말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전력 인프라의 코드, 데이터의 경로, 서버의 위치가 헌법의 조항이 되고 있다.
3. 권력의 전환 ‘통제에서 설계로’
푸코의 권력은 감시(Surveillance)의 장치였지만, AI의 권력은 설계(Design)의 장치다.
AI는 인간의 행동을 억압하지 않는다. 대신 ‘가능성의 지도(Map of Possibility)’를 미리 짜 놓는다. 인간은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리하여 통제(Control)는 사라졌고, 선택(Choice)은 설계된 환상으로 대체되었다.
AI 자본주의는 자유를 주는 대신, 선택지를 미리 짠다. 그 결과 사회는 자유로워졌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 속에 있다. 이것이 ‘비가시적 헌법(Invisible Constitution)’의 본질이다.
4. 산업주권의 철학적 재정의
산업주권(Industrial Sovereignty)은 더 이상 국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설계의 권리(Right to Design)에 관한 문제다.
기술을 보유한 자보다 설계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다.
미국의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24년 블랙록·브루크필드와의 협약에서 “Private Capital will build the state.”라는 문장을 명시했다. 자본이 국가를 짓는다는 말이다.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주권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의 귀환이란, 기술의 국유화가 아니라 설계권의 회복이다.
다음 회는 ‘제2부. 국가의 귀환, 산업주권의 헌법’이 게재됩니다.
#AI자본주의 #산업주권 #설계의정치학 #데이터전력산업 #패시브통치 #블랙록 #에너지안보 #통치성 #한병철 #국가의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