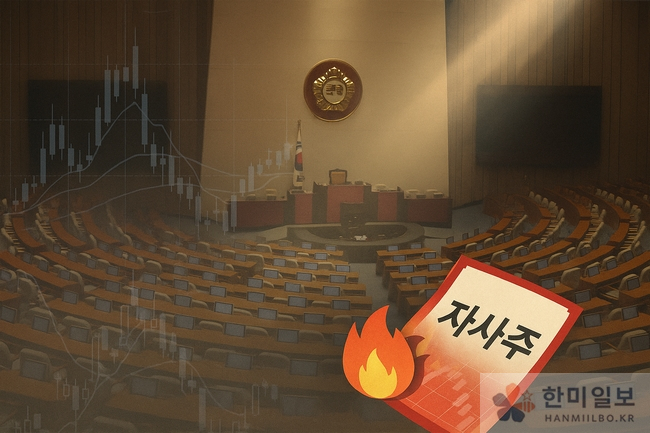 국회 본회의장에 ‘자사주 소각’ 논의의 열기가 번지고 있다. 헌법적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재벌개혁 2.0’의 상징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은 막히고 시장은 회피하지만, 정치만은 프레임을 남긴다. 한미일보 그래픽
국회 본회의장에 ‘자사주 소각’ 논의의 열기가 번지고 있다. 헌법적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재벌개혁 2.0’의 상징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은 막히고 시장은 회피하지만, 정치만은 프레임을 남긴다. 한미일보 그래픽
“효과는 없어도 상징은 남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쟁은 이 문장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이 법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재벌개혁 2.0’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 강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취득한 자사주는 상법상 정당한 재산이며,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기존 재산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존 보유분까지 포함한다면 동일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입법자는 ‘기존분 제외’라는 경과조항을 둘 수밖에 없고, 이 조항이 들어가는 순간 법의 효력은 사라진다. 개정안은 헌법에 막히고, 시장은 이미 방어책을 준비했다. 민주당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이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 행위다.
기업들은 법보다 빠르다. 자사주 보유가 제한되면 교환사채(EB), 신탁, 해외SPV 등을 통해 간접 보유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회계·법무팀 중심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 중이며, 일부는 선제적 자사주 매각 후 ‘재취득 루프(loop)’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상법 개정안은 실효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법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다. “재벌을 통제하겠다”는 선언,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 그것이 전부다.
입법이 아니라 정치의 제스처가 되는 순간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실효성보다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 꼼수’로 규정하고, 이를 소각시키는 모습을 ‘재벌개혁 2.0’으로 포장한다. 2000년대 초 ‘순환출자 해소’로 상징되던 1기 재벌개혁이 구조를 건드렸다면, 이번 2기는 이미지를 다룬다.
즉, 시장의 구조보다 ‘도덕의 프레임’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재계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벌의 유보금과 자사주를 통제한다”는 이미지는 정치적 정의(justice politics) 로 작동한다. 입법이 성공하지 않아도 상징만으로 이긴다. ‘개혁을 시도했다’는 장면 자체가 정치적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이 법안을 직접 시행할 목적보다 ‘통제 신호’로 활용한다.
기업 입장에서 소각 강제는 잠재적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정치가 쥐면, 이후 세제 혜택·규제 완화·공공입찰 등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활용해 재계를 사실상 ‘조정 테이블’에 앉혔던 방식과 같다.
입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추진 그 자체가 압박 도구가 된다. 법이 아니라 위협이, 조항이 아니라 공표가 힘을 갖는 구조다. 그들이 원하는 건 통과가 아니라 “통과될 수 있다”는 공포의 정치학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목적은 정치적 면책의 설계에 있다.
향후 경기 둔화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정부는 책임을 재계에 넘길 수 있다. “우리는 주주환원을 유도했지만, 기업이 거부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구조가 바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위임된 실패(delegated failure)’ 전략이다.
즉, 실패의 원인을 미리 설정해두고,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을 시장 탓으로 전가하는 장치다. 입법이 작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정치적 언어만 남으면 된다. “우리는 기업의 탐욕을 견제하려 했다”는 문장 하나면 실패조차 정치의 성과가 된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의 상징 장치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통제하려 했다”는 시도 자체가 권력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상징통치(symbolic governance)’, 그리고 민주당이 구사하는 ‘재벌개혁 2.0’의 언어다.
그 언어의 목적은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윤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관리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한, 그들은 이미 승리한 셈이다.
법이 실패해도 정치가 이긴다. 그것이 ‘효과 없는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식 정치경제의 아이러니다.
#자사주소각 #상법개정안 #재벌개혁2.0 #위임된실패전략 #상징통치 #정치경제분석 #기업통제 #주주환원논쟁 #한미일보